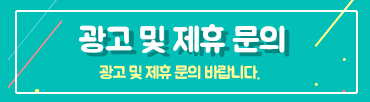- AI가 발전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 가져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데 쓰이는 악성코드.
해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젠 챗GPT 같은 AI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
악성코드를 만들어주는 AI가 거래될 정도다.
[오재학/보안업체 S2W 선임연구원 : "수많은 조직 필요 없이 몇 명만으로도 활동 활동할 수 있는 해킹 그룹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AI 법을 통과시킨 건, 이 같은 보안 문제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허용되지 않는 AI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AI가 만든 콘텐츠는 꼭 표시하도록 했다.
[유창동/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해당 법안에서) 고위험 영역 그리고 규제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른바 '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이다.
선 규제, 후 허용이냐, 선 허용, 후 규제냐 등의 첨예한 입장 차를 조율해 내는 게, 새로 들어설 국회의 역할이다.
[허진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 :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어떻게, 이런 위험이 없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하느냐'라는 사후약방문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단말기유통법 폐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방지를 위한 이른바 '플랫폼 규제법'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이다.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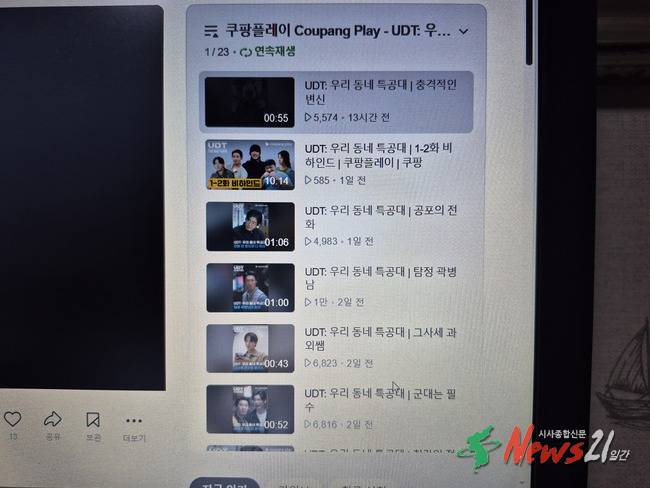 'UDT 우리 동네 특공대'의 시놉시스 표절! 점입가경!
'UDT 우리 동네 특공대'의 시놉시스 표절! 점입가경!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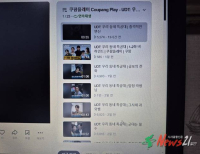

 [칼럼] 갑박한 세상, 긍정의 말이 세상을 품는다
[칼럼] 갑박한 세상, 긍정의 말이 세상을 품는다
 울산 학교 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대구와 나눈다
울산 학교 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대구와 나눈다
 추위로 뭉쳐 있는 참새
추위로 뭉쳐 있는 참새
 인제 자작나무숲
인제 자작나무숲
 경주 하곡리 마을 은행나무
경주 하곡리 마을 은행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