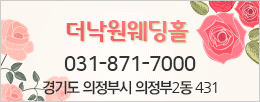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 양자점* 물질(황화납)의 화학적 결합의 특성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이론적으로만 알려진 광전류값에 근접한 양자점 태양전지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향후 효율이 뛰어난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 양자점 : 화학적 합성 공정으로 만든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체로, 높은 흡광특성, 쉬운 밴드갭 엔지니어링 등의 특성으로 태양전지용 재료로 각광 받고 있음
○ 성균관대 박남규 교수(53세)와 이진욱 학생(제1저자)이 주도하고 삼성종합기술원, KIST, 이화여대가 공동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 및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저널인 ‘네이처’가 발행하는 ‘Scientific Reports’최신호(1월 10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Quantum-Dot-Sensitized Solar Cell with Unprecedently High Photocurrent)
□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그린에너지로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효율이 높은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차세대 태양전지 중에서 유기염료(색소) 대신 나노크기의 반도체인 양자점을 산화물 표면에 흡착한 양자점 감응 태양전지는 제조과정이 간편하고 저렴하여 미래 유망 태양전지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 효율이 높은 양자점 태양전지를 개발하려면, 가시광선 전 영역과 근적외선 영역까지 흡수할 수 있고(판크로마틱 광흡수) 다양한 양자점 크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양자점 물질(황화납, PbS)로 광전류밀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PbS 양자점을 이용한 태양전지 중에서 가장 높은 광전류값은 제곱 센티미터당 약 19밀리암페어로, 이론값(38밀리암페어)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론값에 비해 왜 1/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못했다.
□ 박남규 교수 연구팀은 PbS 양자점의 전류밀도가 낮은 원인이 양자점을 구성하는 원소간의 화학적 결합특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아냈다. 또한 소량의 수은(Hg)을 결정격자 안에 안정화시키면 화학적 결합과 결정성이 강화되고 광전특성도 우수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공유결합세기가 강할수록, 원소간 규칙적으로 배열될수록 광전자 발생 효율이 증가한다는 관계
○ 박 교수팀은 수은으로 덮인(도핑된) PbS 양자점의 강화된 화학적 결합특성으로 유도된 우수한 광전특성을 이용해, 광전류밀도가 표준 태양광조건*에서 이론값에 가까운 세계 최고 수준인 30밀리암페어(mA/cm2)의 양자점 태양전지(5.6% 효율)를 개발하였다.
*) 표준 태양광조건: 태양전지에 입사하는 태양광의 세기가 1cm2당 100mW 조건(1태양조건)
○ 또한 이번에 개발된 고광전류 양자점 태양전지는 납(Pb) 및 수은 양이온과 황(S) 음이온을 연속적으로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타늄(TiO2) 입자 표면에 흡착 반응하여 상온에서 20분 이내 간편하게 광전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정시간이 짧아지고(기존 유기염료는 최대 하루 이상 소요), 기존의 광전류값(19밀리암페어)에 비해 약 1.6배 높다.
□ 박남규 교수는 “양자점 태양전지에서 광흡수 양자점 물질의 화학적 결합특성을 파악하고 화학결합을 미세하게 조절하면 이론값에 가까운 광전류를 실현할 수 있고, 앞으로 초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에도 중요한 과학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 TAG
-
 .23일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SNS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 일행과 환담을 나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밈(meme)으로 소통하는 기초의회, 처음이지?’울주군의회 공식 인스타그램 ‘릴스’ 콘텐츠 호응시흥시의회 운영위원들도 벤치마킹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의 공식 인스타그램 콘텐츠가 ‘태생적으로 재미없다’는 기초의회 공식 SNS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 기존 카드뉴스나 활동사진 위주의 일방...
.23일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SNS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 일행과 환담을 나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밈(meme)으로 소통하는 기초의회, 처음이지?’울주군의회 공식 인스타그램 ‘릴스’ 콘텐츠 호응시흥시의회 운영위원들도 벤치마킹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의 공식 인스타그램 콘텐츠가 ‘태생적으로 재미없다’는 기초의회 공식 SNS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 기존 카드뉴스나 활동사진 위주의 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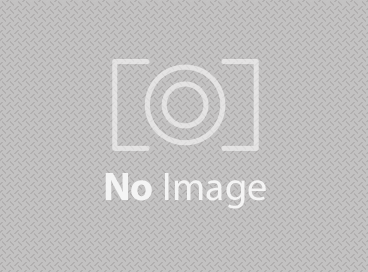 [부고] 변진경 씨(시사IN 편집국장) 부친상
[부고] 변진경 씨(시사IN 편집국장) 부친상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순천만
순천만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박각시
박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