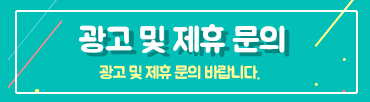- 고용서비스 혁신, ’17년 일자리예산으로 본격 시행
정부는 최근 제조업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적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개편한다.
먼저, 일자리분야 예산안은 금년(15조 8,245억원) 대비 1조 6,984억원(10.7%)이 늘어난 17조 5,229억원(정부총지출 400.7조원 대비 4.4%)으로 이는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도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지난 KDI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3.7%)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가 185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며 이중 고용노동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예산의 대부분(93.2%)을 차지한다.
직업훈련 사업은 훈련참여자에 대한 정보 확대와 선택권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간 직업훈련시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적 훈련정보와 훈련과정 내에서 훈련참여자가 선택하는 공급자 중심의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HRD-net(직업훈련전산망)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 교·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 정보를 전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찾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직종명, 훈련범위, 훈련수준 등을 표준화하여 수요자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직종별 물량 통제방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분야, 훈련규모 등이 결정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좋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개인별 자비부담을 낮추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간 제한을 두었던 수강료 상한규제도 폐지하여 고급과정이 개설될 수 있는 훈련시장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직종과 수준이 동일한 훈련과정이라도 사업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복잡한 사업 구조를 대폭 정비한다.
즉 7개 실업자 훈련사업은 실업자계좌제 등 4개로, 8개 재직자 훈련사업은 사업주훈련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기존 15개의 실업자·재직자 훈련이 8개로 정비된다.
한편,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참여기업에 채용까지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17년에는 4년제 20개교에 220억원, 전문대학 44개교에 758억원 총 978억원을 산학협력 선도대학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미래 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전략 구체화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연합지구(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통합실증지로 선정돼 준도심 실증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
울산시 미래 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전략 구체화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연합지구(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통합실증지로 선정돼 준도심 실증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

 추운 겨울밤 길에 쓰러진 어르신에게 생긴 일!
추운 겨울밤 길에 쓰러진 어르신에게 생긴 일!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러시아 핵전력 강화 방침…우크라이나 “전면 확산 우려”
러시아 핵전력 강화 방침…우크라이나 “전면 확산 우려”
 북한 김주애 공개 활동 확대…후계 구도 해석 분분
북한 김주애 공개 활동 확대…후계 구도 해석 분분
 북한 평안북도, 연휴 기간 일부 소비활동 활기
북한 평안북도, 연휴 기간 일부 소비활동 활기
 북한 양강도, 당대회 맞아 간부 교육·사상 점검 강화
북한 양강도, 당대회 맞아 간부 교육·사상 점검 강화
 우크라이나 송유관 운용 중단에 슬로바키아, 전력 공급 차단 경고
우크라이나 송유관 운용 중단에 슬로바키아, 전력 공급 차단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