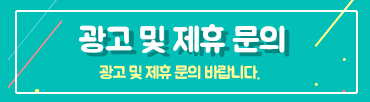정부의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1998년 기준 현재 2,153 만 명의 수도권 인구를 2020년 최대 2,570 만 명까지 증가를 부르는 계획으로 사실상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가 약417 만 명이 증가해 현재 부산인구만큼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그동안 건교부가 표방해온 국토균형개발과 수도권과밀억제 등 조화로운 광역도시권의 미래상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즉 수도권주택공급에 치우쳐 5개 신도시보다 많은 주택을 그린벨트에 공급한다는 계획만을 담고있을 뿐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는 과거 강북의 종로와 중구의 지가상승을 야기 시킨 부동산투기로 인한 주택난을 잡기 위해서 훨씬 큰 규모로 강남을 개발했고, 이어 더 큰 규모의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했다. 이젠 그것도 부족해서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선진적인 제도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서울과 연접하여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수도권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 만아니라 현 정권의 도덕적 해이 수준의 정책결정이다.
정부는 IMF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타계책으로 건설경기부양정책을 쉽게 선택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과열경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5만여 여개 이상의 건설시장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이들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풀다보니, 건설업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수도권인근에 지나치게 건설이 집중되었고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준농림지역에 규제완화를 틈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교통망도 확보되지 않은 장삿속 위주의 아파트가 난립된 것이다. 즉 정부가 난개발을 부추긴 꼴이 되었고, 이는 기존의 신도시의 거주인구의 삶의 질을 격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도권과밀화 문제의 폐해는 절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은 전국대비 11.8%밖에 되지 않는 면적에 전국인구의 50%가 집중되어있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국가의 공공기관의 84.4%, 10대 명문대학 80%, 30대그룹 주력기업의 본사 88%가 몰려있고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상업집중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거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집중에 따른 만성적인 주택부족 현상은 늘 수반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아파트와 공단의 미분양 사태를 야기시켜 지역 간의 경제격차를 심화시키고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있는 원인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부족을 외치기에 앞서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지방의 고등교육지원, 지방산업의 육성, 중앙권한의 지방의 선별적 이양 수도권 집중억제, 지역균형개발 기금확보, 청와대에 상설전담기구설치 등 이미 제시된 제안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해야한다.
<이용락 기자 rak@krnews21.co.kr>
- TAG
-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강력 반발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강력 반발
 우크라이나 중부 50만 가구, 러시아 공격 여파로 이틀째 정전
우크라이나 중부 50만 가구, 러시아 공격 여파로 이틀째 정전
 북한 혜산시, 국가 주도 밀수 중단에 수입품 가격 급등
북한 혜산시, 국가 주도 밀수 중단에 수입품 가격 급등
 북한 삼수군서 방랑 소녀 2명 사망…당국 조용히 처리
북한 삼수군서 방랑 소녀 2명 사망…당국 조용히 처리
 울산여상, 퇴직 선배의 장학금 후배들의 취업 성공 꽃 피웠다
울산여상, 퇴직 선배의 장학금 후배들의 취업 성공 꽃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