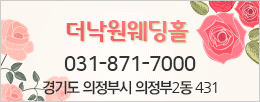권정우 / 북갤럽′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시인을 즐겨 읽도록 하자. 시인이야말로 그 나라 자체이고 그 나라의 모든 위대함이요, 감미로움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전수할 수 없는 유산이어서 사람들은 그 유산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조지 기싱)
읽기 편한 시 감상글 『우리 시를 읽는 즐거움』은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고급 시 독자 권정우가 우리에게 소문난 시 20편을 골라 시 감상의 한 유형을 제시한 책이다. 이를테면, 감소월의 「진달래꽃」이나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등은 막연하게 명시라고만 알려져 있지, 정말 그러한 시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이유를 따져본 독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기이한 현상의 배후에는 주입식 교육의 그늘이 있을 것이다. 지은이는 시를 단순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편이라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시와 관련된 지식을 갖춘 것을 시를 아는 것으로 여겼다. 이때, 지식이란 시인의 생애나 작품경향, 혹은 시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시와 관련된 많은 것을 알아도 정작 시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에 대한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한가지 해석만 강요되기 쉽다. (중략).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잃어버리면 독자는 시를 읽는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시도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시를 작품 자체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야말로 시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시를 감상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시를 쓰는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이 문제인데,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시에서만큼 딱 들어맞는 말이 없다. 시를 읽을 줄 아는 왕도는 시를 많이 읽는 것이지만 좋은 스승이나 감상글을 대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욕심이 지나쳐서 섣불리 평론을 대하면 도리어 시에 있는 정마저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요즘은 평론이 시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시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론은 좀 뒤로 미뤄도 무방할 것이다. 지은이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시를 그 나름의 독법으로 찬찬히 읽어나가는데 고등학교 시절 ′현대문학′을 공부한 수준이면 지은이의 말뜻을 알아듣는 데 아무런 지장
이 없다. 그러나 학교 수업처럼 시험을 염두에 둔 뜻풀이가 아님은 물론이다. 도리어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에 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은이의 주관을 좀 더 전진 배치함으로써 시를 읽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연역해낸다. 왜냐면 시 읽기는 항상 ′현재 읽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인은 서른이라는 나이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인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스물과 서른도 함께 그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가 이론처럼 행세하는 80년대에서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로 평가받는 시대인 90년대로 넘어가는 시대상황이다. 이 시(「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정교하게 결합됨으로써 서른 노래의 백미가 될 수 있었다."
<김동진 기자> dong@krnews21.co.kr
- TAG
-
 HD현대미포기능장회, 취약계층에 추석맞이 푸드꾸러미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HD현대미포기능장회(회장 김정규)는 9월 18일 저녁 6시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에서 취약계층 100가구를 위해 회원들이 정성스레 제작한 400만원 상당의 푸드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푸드꾸러미는 HD현대미포기능장회가 추석을 앞두고 400만원을 기부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무국, 고등어 캔, 김 등 실...
HD현대미포기능장회, 취약계층에 추석맞이 푸드꾸러미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HD현대미포기능장회(회장 김정규)는 9월 18일 저녁 6시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에서 취약계층 100가구를 위해 회원들이 정성스레 제작한 400만원 상당의 푸드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푸드꾸러미는 HD현대미포기능장회가 추석을 앞두고 400만원을 기부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무국, 고등어 캔, 김 등 실...

 한가인·연정훈 부부, 불화설 해명…"식성 달라 따로 밥 먹을 뿐"
한가인·연정훈 부부, 불화설 해명…"식성 달라 따로 밥 먹을 뿐"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목록으로






 박각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부산 해운대 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