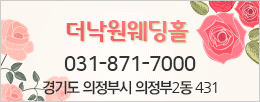올해 사상 최대 크기를 기록했던 남극 상공 성층권의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 남극 지역의 자외선조사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최근 발표했다.
해로운 자외선의 침투를 막는 오존층 두께가 50% 이상 얇아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오존층 구멍′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해마다 남극의 겨울철이 끝나는 8월이면 나타나 9월 중순경에 가장 커졌다가 주변의 오존으로 대부분 메워지고 있는데 WMO의 오존층 전문가 마이클 프로피트는 "오존층 구멍이 점점 커지고 깊어질 뿐 아니라 지속 기간도 더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9월 중순 오존층 구멍의 크기는 2천800만㎢로 3년 전 기록됐던 사상 최대의 크기와 맞먹으며 9월 말에는 그 크기가 최고에 달했고 지속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피트는 "구멍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동안 현재와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존층이 줄어들면 태양에서 발산되는 해로운 자외선이 지구상에 그대로 도달하게 되는데 자외선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고 먹이 사슬의 밑바닥에 있는 미세 식물이 파괴될 수 있다.
WMO는 그러나 오존 구멍이 현상태를 유지한다 해도 남반구에서 해가 높이 뜨는봄까지는 남극권의 자외선 조사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가 낮게 뜨면 자외선은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면서 두꺼운 오존층을 통과해야하지만 해가 높이 뜨면 더 많은 자외선이 오존 구멍을 통과해 지구에 직접 조사된다.
WMO는 `오존층 구멍′이 존재하지 않았던 지난 1964-1976년 사이의 오존치에 비해 50%가 줄어든 가장 얇은 오존층 구멍의 면적이 처음으로 1천500만㎢라는 기록을세웠으며 지난 달 26일에는 전체 오존층 구멍 면적의 3분의2나 되는 1천800㎢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얇은 오존층 구멍의 면적이 1천만㎢에 달했던 적은 4차례 뿐이었다.
프로피트는 그러나 올해보다 오존 구멍이 작았을 때도 오존 함유량이 더 적었던해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 올해 나타난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단언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오존은 대부분 적대지방 상공에서 햇빛이 대기권 높은 층의 산소와 결합하면서자연적으로 생성되며 남극 상공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겨우내 어둠 속에 잠겨 있던 남극 상공에서 태양이 뜨기 시작하는 8월에는 극도의 저온으로 줄어들었던 오존 감소 현상이 활발해 지기 시작한다.
최근 여러 해 동안 각종 에어로졸과 냉장고에 들어있는 프레온가스(CFC)가 배출되면서 자연적인 대기의 균형이 파괴됐으며 지난 20년간 극(極)소용돌이 안에 오존층 구멍이 형성돼 왔다.
해마다 남극 상공 성층권에 형성되는 일정한 형태의 기류를 뜻하는 극 소용돌이의 올해 범위는 3천367㎢를 기록했던 지난 2000년과 비슷한 규모이다.
지난 1989년 몬트리올 협약으로 CFC 배출이 규제되면서 대기권 하층부에서는 CFC 농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성층권 상층부에서는 최근 최고치에 달한 뒤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자들은 오존층 구멍의 출현이 중단되는 데 50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 TAG
-
 추석 맞이 군 장병 등 위문금 전달
여주시는 지난 9월 18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여주시 관내 군부대와 여주시의 군·관 협력에 도움을 준 장호원 소재 육군 제7기동군단을 방문하여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문했다.여주시는 육군 제7기동군단과 7공병여단, 3901부대 2대대, 9520부대, 6508부대, 9158부대를 방문하였고, 추석연휴 동안 고생하는 군 장병들에게 고...
추석 맞이 군 장병 등 위문금 전달
여주시는 지난 9월 18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여주시 관내 군부대와 여주시의 군·관 협력에 도움을 준 장호원 소재 육군 제7기동군단을 방문하여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문했다.여주시는 육군 제7기동군단과 7공병여단, 3901부대 2대대, 9520부대, 6508부대, 9158부대를 방문하였고, 추석연휴 동안 고생하는 군 장병들에게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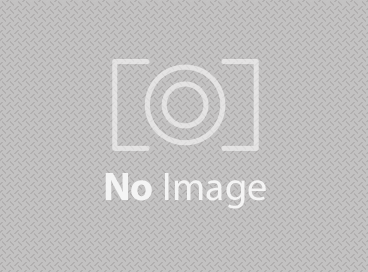 [부고] 김두완 씨(시사위크 정치부 팀장) 모친상
[부고] 김두완 씨(시사위크 정치부 팀장) 모친상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목록으로






 박각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부산 해운대 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