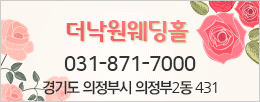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 노동부, 비정규직보호법 관련 100문 100답 발간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럴 수 있다’이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 일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 즉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8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00일을 맞아 비정규직법에 대해 노사가 궁금해하는 100가지 궁금증과 그에 대한 해답을 담은 ‘비정규직 질의회시집’을 발간했다. 회시집은 이 외에도 비정규직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2006년부터 일해 온 기간제근로자가 2008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2010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2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간제법은 이번에 처음 제정된 법이어서 부칙 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한 업체가 A씨를 파견근로자로 2년을 넘게 사용한 후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할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은 이런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 파견법은 2년 초과 사용시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를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해 쓸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사업주가 A씨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사회통념상 불합리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면 직접고용 의무를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제스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직접고용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행정해석집이 비정규직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정규직법이 우리 사회에 조기 안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정책자료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TAG
-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

 한가인·연정훈 부부, 불화설 해명…"식성 달라 따로 밥 먹을 뿐"
한가인·연정훈 부부, 불화설 해명…"식성 달라 따로 밥 먹을 뿐"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목록으로






 박각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부산 해운대 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