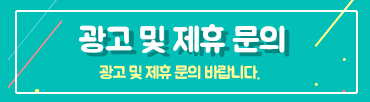상속 재산 1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는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 만들어져 2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상속세는 이제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의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부의 대물림을 막는 효과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됐다.
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세율을 내리는 방안 외에도 관심을 끄는 건 상속인 사이에 분쟁까지 부르는 과세 방식 개편이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유산 취득세일 때는 714만 원을 내야 한다.
5억 원으로 액수가 큰 배우자 공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산 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다.
상속 재산이 이보다 많으면 유산 취득세가 유리하다.
상속액이 늘수록 세액 감소 폭은 커진다.
상속 재산을 나누면서 과표 구간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족 숫자이다.
유산 취득세 구조상 상속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뿐인 경우, 자녀 1명당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려도 상속 재산 50억 원까지는 현재 방식이 더 유리하다.
자녀 1명이 일반적인 지금 세대에는 유산 취득세 전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단 얘기이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라면 유산 취득세 전환 시 각종 공제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민주당, 내홍에 주목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민주당, 내홍에 주목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중국 체류 탈북민, 의료 사각지대 여전
중국 체류 탈북민, 의료 사각지대 여전
 러시아 공습, 우크라이나 물류센터 파괴…키이우 70% 정전
러시아 공습, 우크라이나 물류센터 파괴…키이우 70% 정전
 북한 ‘봉학맥주’, 중국 시장 첫 진출
북한 ‘봉학맥주’, 중국 시장 첫 진출
 한파로 양강도 상수도관 파열, 주민 수도 공급 중단 사태
한파로 양강도 상수도관 파열, 주민 수도 공급 중단 사태
 우크라이나·러시아 교전 장기화, 인프라 피해와 한파로 피해 확대
우크라이나·러시아 교전 장기화, 인프라 피해와 한파로 피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