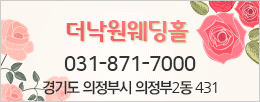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 옛날에는 비싼 음식 파는 ‘전문음식점’ 따로 있었네
2012년 01월 26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위생법’제정 50주년을 맞이하여 반세기를 회고하면서 식품안전 변천사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1900년부터 여러가지 규칙 등으로 존재하던 식품 관련 위생법규들을 통합하여 지난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었다. 당시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던 ‘보릿고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오늘날 ‘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주요 내용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장난감에 유해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제외국의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시절에도 어린이의 안전을 중요시했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식량자급이 절실했던 1970년대에는 ‘혼·분식 먹기 범국민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76년 ‘무미일(쌀 없는 날) 지키기’ 조항이 신설되었다. 당시 음식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회 이상 쌀밥을 팔지 못하고, 잡곡도 20~30% 이상 섞어야만 했으나, 통일벼 보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식량자급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75년에는 고가의 전문음식만 파는 ‘전문음식점’이라는 업종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가 ‘85년에 대중음식점으로 통합되었다. 전문음식점은 대부분 호텔 등에서 한정식, 로우스트 구이 등을 팔았던 업소로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과 차별화하여 관리되었다.
※ 당시 대중음식점 짜장면 : 최고 350원, 전문음식점 한정식 : 최고 2,500원
한편, 경제 성장과 함께 식품업계의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70년에는 정부가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SF(Superior Food) 식품’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어 3년만에 폐지되었다.
1980년대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개최 하면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87년에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조리장의 위생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기준이 강화되었고, 숟가락, 젓가락 등을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이 신설되었다. 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과 벌칙이 강화되고, 건강보조식품의 효시인 ‘영양 등 식품제조업’이 등장해 식품에 영양성분을 조절하여 만든 영·유아 및 병약자용 식품을 생산하게 된 것도 이 시기다.
1990년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등장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됨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95년에는 보다 안전한 식품제조기반을 구축하고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유흥종사자로 관리되었던 가수, 악사, 무용수가 ’99년이 되어서야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8년에는 식품안전 전담기관인 식약청이 776명의 인원으로 출범함으로써 식품안전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자 식품안전정책이 영업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되었던 시기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표시 제도, 위해식품 공표 및 회수제도가 도입되고, 시민식품감사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정책들이 마련되었다. ‘09년에는 부정·불량식품의 제도·가공·수입 또는 판매등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의 이득금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가 도입되었다.
2010년대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 영업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국내·외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미리 실시토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식약청은 ‘62. 1. 20일 47개 조문으로 시작한 식품위생법이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질적, 양적 개편을 통해 현재의 102개 조문으로 발전했으며,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
 고성군, 차열망 보급으로 폭염에도 피망, 엽채소 생산량·농가소득 '쑥쑥'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민연)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고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시설채소 차열망 보급 사업’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여름철 이상고온에 대비해 총 14개 농가에 20,938㎡ 규모(65동)의 시설하우스에 차열망을 지원했다.이번 사업은 강한 햇볕과 고온으로 ...
고성군, 차열망 보급으로 폭염에도 피망, 엽채소 생산량·농가소득 '쑥쑥'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민연)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고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시설채소 차열망 보급 사업’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여름철 이상고온에 대비해 총 14개 농가에 20,938㎡ 규모(65동)의 시설하우스에 차열망을 지원했다.이번 사업은 강한 햇볕과 고온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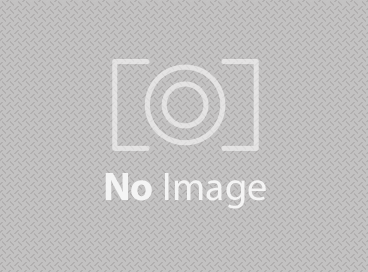 [인사] 행정안전부
[인사] 행정안전부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순천만
순천만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박각시
박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