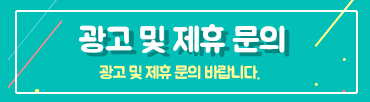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장기간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동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이다. 노동연구원은 26일 '월간 노동 리뷰' 최신호에서 OECD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회원국의 4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Society at a Glance 2009)를 인용해 "한국 남성은 퇴직 후에도 11.2년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공식은퇴연령은 60세지만,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실질은퇴연령'은 71.2세였다.
한국 남성의 퇴직 후 노동기간 11.2년은 멕시코 남성(공식은퇴연력 65세, 실질은퇴연령 73세)의 8년을 압도하는 것으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퇴직 후 노동기간도 7.9년(공식은퇴연령 60세, 실질은퇴연령 67.9세)으로 멕시코 여성의 10년(공식은퇴연력 65세, 실질은퇴연령 75세)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였다.
반면 대다수 서구 선진 복지국가 국민은 오히려 실질은퇴연령이 공식은퇴연령보다 낮아, 일찌감치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남성이 정년보다 6.1년 빨리 은퇴하는 것을 비롯해 룩셈부르크(5.8년), 벨기에(5.4년), 핀란드(4.7년) 등 19개 국가의 남성이 정년 이전에 은퇴했다.
여성은 슬로바키아(7.5년), 룩셈부르크(4.7년), 독일.핀란드(4년), 노르웨이(3.8년) 등 21개국에서 정년보다 일찍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왔다.
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지나치게 긴 이유를 "노후 생계유지에 필요한 연금 액수가 충분하지 않아, 정년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 TAG
-
 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여권 내부 갈등 신호…김종인 “대통령 중심 유지가 국정 안정에 중요”
여권 내부 갈등 신호…김종인 “대통령 중심 유지가 국정 안정에 중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
 북한 시장, 국경 통제로 물가 하락세 지속
북한 시장, 국경 통제로 물가 하락세 지속
 우크라이나-러시아, 아부다비서 전쟁 포로 314명 교환 합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아부다비서 전쟁 포로 314명 교환 합의
 북한 청진 농장, 퇴비 기준 위반 농장원 공개 지적
북한 청진 농장, 퇴비 기준 위반 농장원 공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