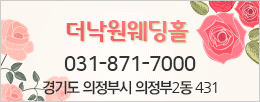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 2002년부터 3100점 인양...문양 등 보존 상태도 좋아
15년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우리에게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국토 확장만을 선물한 것은 아니었다.새만금사업은 33㎞의 방조제로 바닷물을 막는 과정에서 빠른 유속으로 해저 퇴적층의 급격한 유실을 가져왔고 이는 3100점이 넘는 수중의 보물, 고려청자를 안겨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갯벌 층이 씻겨나가면서 800여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려청자가 속살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2일 문화재청과 새만금사업단 등에 따르면 이 유물들이 해저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2002년 4월 한 어민이 9t짜리 소형 저인망어선으로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올라온 고려청자 22종 243점을 관계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은 산하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수중탐사팀을 동원, 예비탐사를 실시해 같은 해역에서 고려청자 211점을 더 건져 올렸다.이후 종합적인 발굴이 시작돼 지난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3100여 점의 고려청자를 인양했다.이들 청자는 발(바리), 접시, 대접, 통형(원통모양) 잔 등 종류가 다양하며 문양은 양각 또는 음각의 연꽃무늬와 모란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온전한 것이 많아 고려청자 연구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다.이들 해저 유물이 어떤 까닭으로 해저에 침몰해 묻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새만금방조제 건설의 영향으로 이 해역의 물살이 빨라져 해저 퇴적층이 깎여나가면서 노출된 것으로 해양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 TAG
-
가수 한강, 소통의 장 '한강 드라이브'로 팬심 저격... 동료 연예인과의 특급 케미 예고! [뉴스21일간=김태인 ]가수 한강님이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 '한강 드라이브'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아티스트와 팬 간의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강님은 이 채널을 통해 더욱 가까이서 팬들과 교류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깊은 노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강 드라이브'는 ...
 우정동, 방문 안내 스티커 제작·활용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다인)가 방문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활용하며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세대 등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등 대민업무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를 해결...
우정동, 방문 안내 스티커 제작·활용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다인)가 방문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활용하며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세대 등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등 대민업무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를 해결...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목록으로






 박각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부산 해운대 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