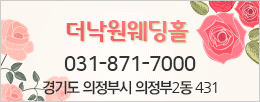관변 사학자, 국정 국사 교과서 등을 통해 개화기 선각자로 떠받을어져 왔던 김옥균, 안창호, 서재필 등...
그들은 과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성역의 존재로 자리한는가? 하지만 그들은 동학의 무장 운동을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소란으로 매도하여 계몽 앨리트에 의한 권위적인 정국 운영을 구상하는가 하면 철저한 지역감정의 소유자였고, 인간의 가치를 국가 권력의 부속물로 여기기도 했다. 이 책은 과감하게 그들의 공과를 지적한다. 즉 그들이 지녔던 상대적인 진보성과 함께 이들로부터 시작된 한국 근대화의 왜곡된 성격이 때로는 어떻게 해방 이후의 박정희의 ′근대담론′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한국 사회의 질곡으로 장요하고 있는지를 설파한다.
그 동안 100년의 한국사는 민족, 국가, 근대화, 부국강병과 같은 집단(국가)과 집단의 이념이 지배해왔고 역사 서술 역시 그러한 시가겡서 이루어져 왔다. 박노자 교수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인간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보며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있다. 기존 담론에서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만 짊어진 채 국가를 이끄는 엘리트들에 의해 계몽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박노자 교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중심 가치로 인권 및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두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사회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때로는 한국의 정치 상황,
- TAG
-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7회 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해 제33회 경기도청소년예술제 문예 부문 짧은 영상(쇼트 폼) 종목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공모전에서도 주제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수상은 포천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 문화예술, 미디어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포천...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7회 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해 제33회 경기도청소년예술제 문예 부문 짧은 영상(쇼트 폼) 종목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공모전에서도 주제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수상은 포천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 문화예술, 미디어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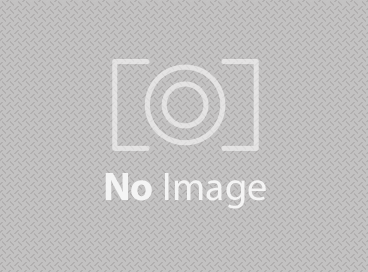 [부고] 김헌태 씨(청주시 상당구 위생팀장) 장인상
[부고] 김헌태 씨(청주시 상당구 위생팀장) 장인상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목록으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부산 해운대 야경
 강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성 높인다
강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성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