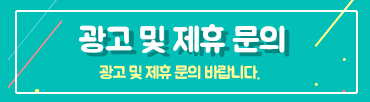삼짇날은 음력 3월 3일로 양력으로 지난 4일 이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로 제비맞이 하는데서 유래되었고 답청절이라고도 하는데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풍속 중 제비마중은 이날 제비를 먼저 보면 그 해 운이 좋으나 늦게 보면 나빴다고 한다. 처녀들은 처음 보는 제비를 향하여 긴 옷고름으로 고를 걸면 그 해가 좋다고 한다. 집에서는 새 쑥을 삶아 밀가루와 버무려 찐 쑥 버무래기를 해 먹었다고 한다. 또, 진달래꽃을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둥글게 지져먹는 것을 화전이라 하고 녹두로 국수를 만들어 꽃물에 넣고 꿀을 타서 잣을 넣어 만든 것을 수면이라 하여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삼짓날놀이는 사내아이들은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서 놀고, 계집아이들은 물고풀을 뜯어서 대나무쪽에 풀끝을 실로 매고 머리를 땋아 가느다란 나무로 쪽을 찌고 헝겊조각으로 노랑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만들어 입혀 새 각시모양을 하여, 요 이불 베개 병풍을 차려 놓고 「각시놀음」을 하고 놀았다고 한다. 또 화전놀이는 떡, 술을 준비해 단체로 소인끼리, 젊은이끼리, 부녀자끼리 패를 지어 산수 좋은 곳을 찾아가 노는 놀이로, ‘꽃놀이’라고도 한다.
특히, 삼짇날 장을 담그면 담근 장에는 고추나 숯을 띄워놓고 부정한 것을 막고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쳤다고 한다.
한식날은 음력 3월 5일 양력으로 지난 6일이었다. 진나라 개자추(介子推)가 면산에 숨어 살았는데 그의 은혜를 입은 문공이 나와 살기를 권했으나 듣지 않자 산에 불을 질러 나오도록 했으나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타죽고 말았음을 애석히 여겨 불을 금하고 야제를 지내 그 혼을 위로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비가 내리는 한식을 ‘물한식’이라 하며, 한식날 비가 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한다. 여러 가지 주과를 마련하여 선산에 가서 성묘하고, 조상의 묘가 헐었으면 봉분을 개수하고 사초도 하다. 나라에서는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하고, 일반인들은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의 음식으로 절사라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한식날에 약밥, 쑥떡, 찬밥을 먹으면 일년 내내 병이 없다고 한다.
- TAG
-
 대왕암등대갈비 가맹사업본부 ㈜명진푸드, 설 명절 맞이 식료품 전달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대왕암등대갈비의 가맹사업본부 ㈜명진푸드(이하 ㈜명진푸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9일 울산광역시동구장에인복지관(관장 이태동, 이하 동구장애인복지관)에 4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하였다. 이번 나눔에는 소불고기, 고추장, 식용유 등 식사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식재료로 구성되어, 동...
대왕암등대갈비 가맹사업본부 ㈜명진푸드, 설 명절 맞이 식료품 전달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대왕암등대갈비의 가맹사업본부 ㈜명진푸드(이하 ㈜명진푸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9일 울산광역시동구장에인복지관(관장 이태동, 이하 동구장애인복지관)에 4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하였다. 이번 나눔에는 소불고기, 고추장, 식용유 등 식사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식재료로 구성되어, 동...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북한, 금 거래 단속 강화로 시장 긴장
북한, 금 거래 단속 강화로 시장 긴장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이달 하순 평양서 개최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이달 하순 평양서 개최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