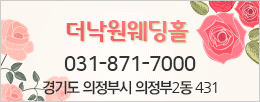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 통계청 분석, 늦은 결혼 · 주출산 인구 감소가 원인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속도가 미국·일본·영국·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대 8배까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늘어난 데다 주 출산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는 평균출생아수(합계출산율)는 지난 1970년 4.53명에서 지난 2003년 1.19명으로 3.34명이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미국이 0.42명 감소한 것에 비해 8배 빠르게 진행된 것이며, 일본(0.84명)·프랑스(0.58명)·독일(0.69명)·이탈리(1.14명)·영국(0.72명) 등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합계출산율을 경험한 시점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가장 낮았던 반면, 미국은 1975년에 1.80명, 프랑스는 1993년에 1.65명, 독일은 1994년에 1.24명 이탈리아는 1997년에 1.18명 등으로 시점이 앞섰다. 특히 이들 선진국들은 최저점을 지난 이후 합계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에 합계출산율(1.16명)이 더 떨어지는 등 최저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작년 출생아수 47만6000명…1970년의 절반 우리나라의 작년 출생아수는 47만6000명으로 1970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1970년 100만7000명에 달하던 출생아수는 1980년 86만5000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1990년 65만9000명, 2000년 63만7000명으로 떨어진 이후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출생아수를 보면 20∼24세는 1981년 33만5600명에서 지난해 3만9500명으로, 25∼29세는 36만1300명에서 19만9100명으로 급감한 반면 30∼34세는 10만2500명에서 18만7600명으로 늘어났다. 출산순위별로 보면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1981년 35만5900명에서 지난해 24만1200명으로 줄었으며 둘째로 태어난 아이는 1981년 29만1200명에서 지난해 18만5600명으로 감소속도가 더 빨랐다. ◆ 25~34세 여성 99년 이후 감소세 이 같이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요인으로는 25~34세의 주 출산여성 인구가 199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데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1981년 23.2세에서 지난해 27.5세로 높아졌다. 주출산인구인 25∼29세, 30∼34세 여성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1970년 각각 88.4%, 94.6%에서 지난해 54.2%, 84.9%로 각각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초혼건수는 1981년 35만건에서 1990년 37만1000건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24만5000건으로 급감했다. 초혼이 전체 혼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1년 95.9%에서 지난해 78.9%로 크게 줄었다. 주출산연령층인 25∼34세 여성인구는 1999년 440만5478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413만154명으로 급감했다. 15∼49세 가임여성인구도 2002년 1378만5000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372만9000명으로 줄었다. ◆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어떻게 활용되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출산율이 낮은 원인에 대한 분석이 개별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이뤄진 적은 있으나, 국가통계기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매년 8월에 전년도 출생·사망 통계를 내놓기는 했지만, 이 같이 원인 분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공인된 통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 TAG
-
가수 한강, 소통의 장 '한강 드라이브'로 팬심 저격... 동료 연예인과의 특급 케미 예고! [뉴스21일간=김태인 ]가수 한강님이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 '한강 드라이브'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아티스트와 팬 간의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강님은 이 채널을 통해 더욱 가까이서 팬들과 교류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깊은 노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강 드라이브'는 ...
 우정동, 방문 안내 스티커 제작·활용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다인)가 방문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활용하며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세대 등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등 대민업무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를 해결...
우정동, 방문 안내 스티커 제작·활용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다인)가 방문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활용하며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세대 등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등 대민업무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를 해결...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목록으로






 박각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부산 해운대 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