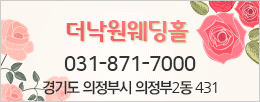어류 및 양서류의 생식기관 조직검사결과 자웅동체 발현율은 1차년도보다 낮게 나타났고 2차년도 까지의 조사결과로는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인한 영향인지, 자연적인 발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내분비계장애물질 87개 중 65개 물질은 불검출, 프탈레이트(DEHP, DEP), 다이옥신, PCBs 등 22개 물질은 검출되었으며 이들중 환경잔류성이 높은 다이옥신, PCBs의 농도는 일본에 비해 낮았다.
국립환경연구원은 2000년12월~2001년12월까지 전국 주요하천, 호소, 습지 등 31개 지점에서 채집한 어류 및 양서류의 생식기관영향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축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조사는 99년부터
2000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99년 수립된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연구사업계획(′99∼′08년)에 따라 수행하였다.
동 사업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사업으로 향후 정밀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1단계 조사이다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어류 및 양서류의 정소, 난소 등 생식기관의 조직변화, 어류 및 양서류 혈액 중 비텔로제닌(vitellogenin)농도, 어류 및 양서류의 체내 축적된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농도분석 등이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붕어·양서류의 생식기관 조직검사 결과>
붕어의 경우 28개 지점 782마리 중 25개 지점 779마리는 정상이었으나 3개 지점에서 각 1개체씩 암컷과 수컷의 성징을 동시에 갖는 자웅동체가 발견되었다. 황소개구리의 경우 26개 지점 1,075마리 중 23개 지점 1,072마리는 정상이나 3개 지점에서 각 1개체씩 자웅동체가 발견,자웅동체 발견지점에 대한 이들의 발현율은 붕어의 경우 3.3∼5.0, 황소개구리의 경우 2.3∼2.4이며 총 개체수에 대한 발현율은 전국적으로 붕어 0.4, 황소개구리 0.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비오염지역 조사결과인 어류 4∼18, 개구리 3∼16 보다 낮은 수준이다. <혈액중 비텔로제닌의 농도 측정결과>
붕어 수컷과 암컷의 비텔로제닌 평균값은 각각 3.5㎍/mL와 541.4㎍/mL로 그 차이가 150배 정도이며 이중 미국의 비오염지역 수컷의 평균값인 10㎍/mL를 초과하는 수컷은 11개체(3.9) 이었다.
미국 어류의 비텔로제닌 평균값(10㎍/mL) 초과율은 34∼50로서 미국에 비하여는 현저히 낮으며, 또한 10 ㎍/mL를 초과하는 개체중 생식기관의 자웅동체는 나타나지 않아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로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영향인지 자연현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황소개구리의 비텔로제닌 측정결과 수컷과 암컷의 평균은 각각 128㎍/mL와 350 ㎍/mL로 그 차이가 3배 정도이고 비교분석할 만한 양서류의 비텔로제닌 연구사례가 없어 생태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축적실태 분석결과>
내분비계장애물질 35물질군 87물질중 PBBs, DDT, 엔도설판 등 65개 물질은 전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PCBs 등 22개 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들중 다이옥신, PCBs 등 18개 물질은 1차 및 2차 조사에서 연속적으로 검출되었으나 농도는 1차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환경잔류성이 높은 다이옥신의 경우 어류에서 0∼1.309 pg-TEQ/g, 양서류에서 0∼1.258 pg-TEQ/g, PCB의 경우 어류에서 ND∼31.33 ㎍/kg, 양서류에서 ND∼9.74㎍/kg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수준
은 일본의 조사결과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자웅동체가 나타난 개체에 대한 비텔로제닌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축적 농도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인한 영향은 발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1차 및 2차 조사시 연속적으로 검출된 물질에 대해서는 측정·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검출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원조사를 실시하여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내 서식 어류 및 양서류의 생식기관 발달주기, 비텔로제닌의 계절변화 등 생물학적 지표(biomarker)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석환 기자 suk@krnews21.co.kr>
- TAG
-
 서천군가족센터, SPC삼립 서천공장 직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서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6일 SPC삼립 서천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센터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전문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중 50%...
서천군가족센터, SPC삼립 서천공장 직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서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6일 SPC삼립 서천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센터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전문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중 50%...

 이스라엘군 가자시티에서 지상작전 이틀째 총공세
이스라엘군 가자시티에서 지상작전 이틀째 총공세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목록으로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3년 유예 요청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3년 유예 요청
 이끼
이끼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 관급공사 대금 체불 예방에 총력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 관급공사 대금 체불 예방에 총력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