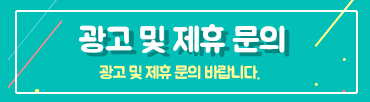기획재정부는 3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가계부채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으나, 취약계층 및 제2금융권 등으로 전이될 위험은 일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저소득층은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소비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상환부담 증가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1999~2002년 경제회복기와 2005~2006년 주택시장 호황기에 급증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줄면서 96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GDP 및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보다 빠르게 늘어나 전체 가계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8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10위에 올랐다.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9%로 7위,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비율은 2.09배로 20위 수준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및 카드사태 등과 비교해볼 때 현재의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과 비교해도 가계대출 연체율이나 채무상환 부담 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는 가계부채 소득을 확충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 TAG
-
 대전태평교회, 저소득층을 위한 설 명절 상품권 후원
대전 중구 오류동(동장 조명화)은 5일 대전태평교회(담임목사 한상현)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달라며 상품권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대전태평교회는 취약계층 가정이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설날과 추석에 상품권(1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사 대접과 반려식물 만들기 등을 통...
대전태평교회, 저소득층을 위한 설 명절 상품권 후원
대전 중구 오류동(동장 조명화)은 5일 대전태평교회(담임목사 한상현)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달라며 상품권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대전태평교회는 취약계층 가정이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설날과 추석에 상품권(1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사 대접과 반려식물 만들기 등을 통...

 북한 청진 농장, 퇴비 기준 위반 농장원 공개 지적
북한 청진 농장, 퇴비 기준 위반 농장원 공개 지적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북한 청진 농장, 퇴비 기준 위반 농장원 공개 지적
북한 청진 농장, 퇴비 기준 위반 농장원 공개 지적
 북한 91훈련소, 병사 지원금 일부 지휘관 개인 용도 전용 확인
북한 91훈련소, 병사 지원금 일부 지휘관 개인 용도 전용 확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5만5천명…돈바스 장악엔 러시아 80만명 필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5만5천명…돈바스 장악엔 러시아 80만명 필요"
 미·러·우크라 3자 회담 아부다비서 재개…군사 문제 협상 집중
미·러·우크라 3자 회담 아부다비서 재개…군사 문제 협상 집중
 울산교육청, ‘서사초등학교’ 준공 …3월 개교 준비 박차
울산교육청, ‘서사초등학교’ 준공 …3월 개교 준비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