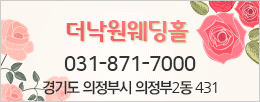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 IBS(기초과학연구원·원장 오세정)는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연구단(단장 유룡) 그룹리더팀(KAIST 화학과 이효철 교수, 정양욱 박사)이 단백질 내 화학반응의 전이상태와 그 반응경로를 3차원 구조로 실시간 규명하고 제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케미스트리誌(Nature Chemistry) 2월 4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교신저자 이효철 교수, 제1저자 정양욱 박사)
□ 우리 눈은 사물을 약 75 마이크로미터 크기까지 식별가능하고 사물의 움직임은 약 1/10초까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총알의 움직임 같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빠른 움직임을 보려면 초고속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총알의 움직임 보다 훨씬 빠른 분자의 움직임을 보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ㅇ 그 동안 과학자들은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분자의 움직임을 연구해 왔다. 특히 눈의 망막 세포에서 빛을 인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분자의 움직임 같이 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연구해왔다.
ㅇ 하지만 레이저 기술만으로는 분자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엑스선 회절법이나 핵자기공명법이 이용되는데 이런 방법들은 분자의 움직임 같은 빠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다.
ㅇ 레이저 기술과 엑스선 회절법 기술을 결합한 시간분해 엑스선 회절법을 이용하면 빠른 분자의 움직임을 정확한 위치 정보와 함께 측정할 수 있다.
□ 이효철 그룹리더팀은 이와 같은 시간 분해 엑스선 회절법을 이용해 광이성질체화(photo-isomerization)라는 단백질 내 화학반응 중 전이상태와 그 반응 경로를 원자 수준의 3차원 구조로 밝혀냈다.
ㅇ 광이성질체화 반응은 눈의 망막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비슷한 반응으로 빛을 흡수한 특정 분자의 구조가 변화하는 반응이다.
ㅇ 광이성질체화 반응을 포함한 모든 화학 반응은 진행 중 반응 물질의 구조가 변화되는데 이 과정 중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전이상태라고 한다. 이 전이 상태는 1000조분의 1초(10-15초, 펨토초)란 아주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를 3차원 구조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ㅇ 하지만 이 그룹리더팀은 단백질 내부에서는 전이상태 생성속도가 펨토초에서 100억분의 1초 (10-10초, 피코초)로 늦어져 비교적 안정화되는 점에 착안해, 시간 분해 엑스선 회절법을 이용해 단백질 내부에서 전이상태를 관찰하고 규명했다.
ㅇ 이 연구성과는 화학 반응 전이상태 관찰을 통해 전이상태를 조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이는 화학반응 제어를 통한 신약 개발 및 의학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연구진은 광이성질화 반응 경로가 단일경로였던 기존 연구결과와 다르게, 두 종류의 다른 반응 경로가 경쟁적으로 존재함을 최초로 확인했다.
ㅇ 단백질 내부에서는 다른 원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원자가 자신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2가지 반응경로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ㅇ 반응 모습이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과 비슷한 자전거페달(bicycle-pedal) 경로와 훌라 춤을 추는 모양과 유사한 훌라-트위스트(hula-twist) 경로 등 2가지이다.
ㅇ 이는 한산한 지하철 내부에서 사람들은 직선으로 이동하지만 꽉 찬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공간 여유가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원자도 가장 짧은 반응경로를 택해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ㅇ 이렇게 규명된 반응 경로를 바탕으로, 돌연변이를 이용해 전이상태의 안정성을 변화시켜 반응 경로를 제어할 수 있었던 점도 이번 연구의 또 다른 성과이다.
ㅇ 이효철 그룹리더는 “앞으로 차세대 가속기인 엑스선 자유전자 레이저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른 시간대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전이상태 중의 구조 뿐 아니라 나아가 전이상태 이전의 구조도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TAG
-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오늘 기자회견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경사의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파출소 팀장, A 경위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국화꽃을 든 A 경위는 유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검찰은 이 경사의 순직 경위를 밝힐 수사에 속...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오늘 기자회견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경사의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파출소 팀장, A 경위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국화꽃을 든 A 경위는 유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검찰은 이 경사의 순직 경위를 밝힐 수사에 속...

 “어려운 이웃과 명절 음식 나눠요”
“어려운 이웃과 명절 음식 나눠요”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목록으로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박각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