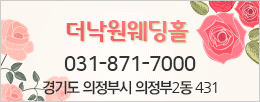국경지대 근처에서 북한의 경비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탈북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4중 통제'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철저하게 봉쇄를 시작했다. 탈북을 도와줬던 국경수비대원이 최근 총살된 것 또한 이러한 북한의 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
주민의 이탈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북한정권이지만, 아직까지 '전파'의 탈북은 봉쇄하지 못했다. 일례로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과 연락이 닿는 것도 북한의 전파관리가 비교적 허술하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와 연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국경지대의 중계소를 거쳐야만한다. 통신을 할 수 있는 전파의 감도가 국경지대 반경 10km 이상 넘어가면 끊어져버린다.
10km 이내일지라도 산 꼭대기에 올라 통화를 해야만 겨우 들릴 수 있는 정도다. 북한 외부에 있는 가족과 단 몇 분의 통화를 위해 북한 주민은 기꺼이 산을 오른다. 탈북을 감행하지 않는 이상 탈북자와 가족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더이상 놔둘 수 없던 북한 정권이 '전파방해기'도 모자라 산 봉우리마다 '전파탐지기'를 설치했다.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소통의 끈을 자르기 위한 '가위'를 준비해놓은 셈이다. 전파탐지기는 몇 분 이상 통화할 경우 위치가 노출된다. 이러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 이상을 통화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또한 늘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싶은 북한 주민은 '몇 분' 가량을 통화한 후, 다른 산 봉우리로 자리를 옮겨 다시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을 시도한다. 위치가 발각되지 않도록하는 그들만의 대응방법인 것이다.
전파조차도 차단을 하기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전해져오는 '라디오 주파수' 때문이다. 2009년 탈북한 김석영씨는 국경지대 주민들이 사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모두 중국 라디오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이유도 있겠지만, 라디오를 통해 심리적 거리까지도 좁혀진다는 것이다. 김씨는 "국경지대의 탈북자가 많은 것도 이같은 이유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의 국경지대 전략은 이처럼 대부분 탈북과 맞물려있다. 이제는 일반 주민과 더불어 '전파'의 탈북마저도 막고있다. 이를 통해 철저히 '닫힌사회'를 지향하는 북한 사회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뉴포커스
- TAG
-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오늘 기자회견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경사의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파출소 팀장, A 경위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국화꽃을 든 A 경위는 유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검찰은 이 경사의 순직 경위를 밝힐 수사에 속...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오늘 기자회견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경사의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파출소 팀장, A 경위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국화꽃을 든 A 경위는 유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검찰은 이 경사의 순직 경위를 밝힐 수사에 속...
 HD현대중공업 현수회,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를 위한 후원금 100만원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HD현대중공업 현수회(회장 오정철)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정 가득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고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찾아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오정철 회장은 “추석은 온정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이웃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
HD현대중공업 현수회, 동구지역 취약계층 세대를 위한 후원금 100만원 전달
[뉴스21일간=임정훈 ]HD현대중공업 현수회(회장 오정철)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정 가득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고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찾아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오정철 회장은 “추석은 온정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이웃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목록으로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박각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