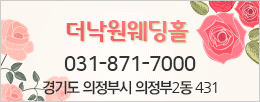"세계화는 노동자들의 덫이 아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농촌의 가족 공동체 붕괴와 산업화에 따른 빈곤층의 열외, 물질이상주의 팽배, 공리주의 개념의 도입한 복지 제도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비주류 계층에 대한 착취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산업사회로의 발전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 내었고 더 많은 부의 창출을 위해 자본주의는 더 넓은 지역으로 착취의 범위를 넓혀야 했다. ′세계화′의 명제 아래 소득 불균형의 확대와 IMF 등 경제적 위기를 맛봐야하는 피착취 국가의 노동자들에게는 ′세계화′라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그러나 OECD의 수석 행정관을 지내기도 한 저자 에단 B. 캡스타인은 ′부의 분배′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한 다년간에 걸친 실증적인 리서치와 연구 결과에 따른 세계 각국의 세계화 분석을 펼쳐 보이며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세계화가 간과해온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부의 분배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동자들과 세계화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개인적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공정성과 효율성의 딜레마 속에서 효율성 위주로 채택된 제도의 수용능력 결핍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앤서니 기든스의 말처럼 기존의 제도의 재구성이나 새로운 제도의 창출이 필요한 것뿐이다. 이런 제도의 문제점에서 저자는 해결책의 하나로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소득의 불균형은 오히려 세계 경제 성장에 해롭다는 인식을 통해 빈곤층을 끌어올려야 더욱 효율적인 부의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타이완이 단순한 국가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택한 타이완을 주목한다. 특히 5장에서는 부의 분배의 문제를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공공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노동자 편에 선 경제 정책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미국이 경제를 비롯한 전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휘두르려는 상황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하며 마이동풍식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이정환 기자> ijw@krnews21.co.kr
- TAG
-
 고성군, 차열망 보급으로 폭염에도 피망, 엽채소 생산량·농가소득 '쑥쑥'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민연)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고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시설채소 차열망 보급 사업’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여름철 이상고온에 대비해 총 14개 농가에 20,938㎡ 규모(65동)의 시설하우스에 차열망을 지원했다.이번 사업은 강한 햇볕과 고온으로 ...
고성군, 차열망 보급으로 폭염에도 피망, 엽채소 생산량·농가소득 '쑥쑥'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민연)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고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시설채소 차열망 보급 사업’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여름철 이상고온에 대비해 총 14개 농가에 20,938㎡ 규모(65동)의 시설하우스에 차열망을 지원했다.이번 사업은 강한 햇볕과 고온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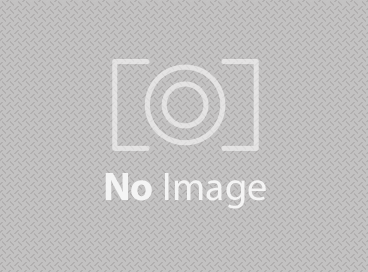 [인사] 행정안전부
[인사] 행정안전부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순천만
순천만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박각시
박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