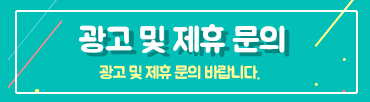[김남식 기자] 조명 받지 못한 유교의 거두 쓸쓸히 잠든 현장을 발굴 취재하다.
- 유교의 거두 상주에서 쓸쓸히 잠들어-
식산 이만부 선생은 평생을 학문으로 일관한 선비로서 ‘한국실학사’에 ‘실심실학자(實心實學者)’로 유학사에서는 ‘자가설(自家設)’을 수립한 성리학자(性理學者)로, 서도에서는 ‘팔분체’의 대가로 문학사에서는 문장가로 일가를 이루었고, 그 외 음악, 회화, 예악에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 조선시대 대표적 청렴의 표상
*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거두
* 학문과 후학 양성에 평생을 매진
* 역사적으로 독보적 저술 문집 집필
* 상주에 위대한 유교 문화의 뿌리
* 불천의로 서원에 모셔진 인물
■ 식산 이만부(息山 李萬敷)
성명 : 이만부(李萬敷) , 1664년 ~ 1732년
본관 : 연안(延安)
자 : 중서(仲舒)
호 : 식산(息山)
출생지 : 서울
출신지 : 상주 노곡
분묘지 : 상주 천주산 (天柱山)
■ 식산 이만부 선생 묘소
▲ 숙종 임금이 내려준 묘지로 봉분이 배 이상 무너져 있으며 길조차 찾기 힘들고 이정표, 안내판 하나가 없다.
■ 식산 이만부 선생 비문
▲ ‘징사 이만부 선생 지묘’ 라고 했다, ‘징사’는 벼슬을 주어도 사양한 사람을 말한다, 청렴한 선비정신을 볼 수 있다.
▲ 현손 ‘이매기’ 두전 큰 글씨를 쓰고 ‘나주 정범조’ 선생이 비문을 짓고 ‘이익운’ 선생이 비문을 씀
■ 태생과 유년 시절
1664(현종 5)∼1732(영조 8).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중서(仲舒), 호는 식산(息山). 아버지는 예조참판 옥(沃)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승지 동규(同揆)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가학으로 학문을 전수받았고, 정주학(程朱學)에 심취하였다.
1678년(숙종 4)15세 때 송시열(宋時烈)의 극형을 주장하다가 탁남(濁南)에게 몰려 북청(北靑)에 유배된 아버지를 따라가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시봉하며 학문을 닦았다.
부친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왔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오직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는 누대(累代)를 서울에서 살았으나 영남 학자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그곳에 이거(移居)하여
후진양성과 풍속교화에 힘쓰며 저술활동을 했다.
■ 청렴한 선비 정신으로 후학 양성과 학문에만 힘을 다해
이만부 선생은 1729년(영조 5) 학행(學行)으로 장릉참봉(長陵參奉)과 빙고별제(氷庫別提)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이만부 선생은 평소에 주염계(周濂溪)·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장횡거(張橫渠)·주자(朱子) 등 5현(賢)의 진상(眞像)을 벽에 걸고 존모하였으며, 이황(李滉)을 정주학의 적전(嫡傳)으로 존숭하였다. 따라서, 성리학적인 견해도 주리적(主理的) 경향도 있다.
선생이 가족과 함께 상주의 외답리 통칭 노실에 안주한 것은 그의 나이 34세 때였다. 현재 외답동 논실에 집을 지어 천운당(天雲堂)이라 명명하고 자신의 아호를 '식산'이라 했다. 논실 남쪽의 산이 식산이었기 때문이다.
글씨에 뛰어났으며, 특히 고전팔분체(古篆八分體)에 일가를 이루었다. 만년에는 역학(易學)에 관해서도 깊이 연구했다.
1575년 선조 8년에 동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시작된 당쟁은 선조 24년에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짐으로서 서인·북인·남인의 3색 당쟁으로 변했고, 1683년 숙종 9년에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렬함으로서 노소남북의 4색당쟁으로 변천하였다. 그래서 1910년의 망국 때까지 당쟁기간을 335년으로 계산했을 때 동인과 남인 북인이 집권한 시기는 30여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백년간은 서인과 노론 소론이 집권했다.
당쟁이 격화함에 따라 잠영세가들 중 자손들이 당파를 달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연안이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제학을 배출한 파는 서인과 노론이었고 영남으로 낙향한 파는 남인 계열이었던 것이다.
상주에 처음 정착한 연안이씨 후손은 ‘식산 이만부(息山 李萬敷)’였다. 그는 ‘근옹 이관징’(芹翁 李觀徵)의 손자이고 박천 이옥(博泉 李沃)의 아들이다. 이관징과 이옥 부자가 현종과 숙종 때 남인의 중심인물로 활약한 것이다.
‘이관징’은 숙종 초 남인이 제2차 예송에서 득세했을 때 대사성 대사헌을 거쳐 예조와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봉조하에 오른 인물이었다. 경연관과 중국에 동지사로 갈 만큼 학문이 높았으며 겸하여 해서체 글씨를 잘 썼고 사후 정희의 시호를 받았다.
이관징의 아들 이옥은 숙종 초 부제학으로 송시열을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다가 같은 남인의 온건파인 영의정 허적에게 내침을 당하여 한때 북청에 유배되기도 하고, 그후 회양부사 등 외직으로 밀려나 지냈다. 그러다가 숙종 15년의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다시 집권할 때 내직으로 돌아와 승지를 거쳐 경기도 관찰사와 예조참판을 역임했다. 그도 부전자전으로 글씨를 잘 썼고 또 문장에 능했는데, 그가 회양부사일 때 금강산의 절경을 읊은 국한문 혼용의 <청회별곡(淸淮別曲)>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버금가는 조선조 가사(가사)문학의 수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만부는 어릴 적부터, 부조가 관직에 있어 어떨 수 없이 당쟁에 휘말려 실상을 목격해 오며 느끼는 바가 있어 애초부터 과거를 마다하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했다. 나이 약관을 넘어전국의 명산을 찾아 슬기로운 의기를 기르고, 선현의 유적지를 심방하여 그들의 드높은 학문의 경지를 차분히 살펴서 착실히 자신을 키워 나갔다.
■ 혜성 같은 석학 거유 이만부
1690년 숙종 16년 이만부는 27세의 나이로 상배를 하고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등, 퇴계 이황과 서애 유성룡의 큰 학덕을 접하고, 상주의 도남서원에 와서 학문을 갈고 닦았다. 이때에 서애 유성룡의 셋째 아들인 수암 유진(修巖柳)의 손녀와 속현하게 되었다.
외가는 전주 이씨로 조선조에서 최초로 <천주실의>등 서양의 학문을 중국에 가서 수입 소개한 실학의 선구자 지봉 이수광이 그의 외고조부이다. 또 병자호란 뒤 좌의정으로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와서 영의정에 오른 이수광의 아들 분사 이성구(汾沙 李聖求)가 그의 외증조였다. 친가 처가 외가가 가지런히 나라 안에서 성명이 우레 같은 명문세가였던 것이다.
■ 이만부 선생이 상주로 낙향하는데 숙종임금과 일화 하나
이만부는 숙부인 동애 이협(東厓 李浹)과 함께 조령을 넘어서 영남으로 낙향하여 상주에 정착하고, 숙부는 안동에 정착했다. 그는 한성을 떠나기 전 숙부와 함께 예조참판인 아버지를 따라 입궐하여 숙종에게 낙향 인사를 드렸다. 숙종은 그들의 낙향 결심이 확고부동한 것을 알고 넌지시 이런 농담을 했다.
"그대들이 영남으로 낙향하는 것은 좋으나 과연 영남에 그대 집안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이 몇이나 될까?"
"성은이 망극하오나, 조령을 넘으면 버들잎과 오얏뿌리가 발에 걸릴 듯하옵니다."
이만부 숙질의 대답인지 예조참판 이옥의 대답이었는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나, 버들잎은 유서애의 풍산 유씨를, 오얏뿌리는 이퇴계의 진성이씨를 이른 말로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식산 이만부는 숙종 연간에서 영조 초에 이르는 시기 상주를 중심한 영남 일원에서 혜성 같은 존재의 석학거유였다. 그는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저술을 오늘에 남겼으며, 아울러 운음 노계원(雲陰 盧啓元), 백화재 황익재(白華齋 黃翼再), 이안당 조천경(易安堂 趙天經), 성호 이익(星湖 李翼)등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저명한 학자를 여럿 길러 내었다.
■ 허미수의 제자
식산 이만부(息山 李萬敷.,1664~1723)篆書帖)가 1723년 장식(張拭)의 주일재명(主一齋銘)을 전서로 쓴 필첩 스승 미수 허목(眉叟 許穆, 1595~1682)의 서풍을 그대로 따라 마치 미수전(眉叟篆)처럼 보인다.
■ 천운정사에서 학문을 벗 삼다.
▲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천운당 (지방민속자료 제 76호) 현재 식산정사, 노곡서당은 없다, 마을 입구에는 문화재 이정표가 없었다.
이만부 선생은 논실(외답동)에 터를 잡고 '식산정사'라는 당호를 붙이고 집을 지었다. 지금은 이만부 선생의 서재였던 '천운정사' 가 남아 선생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천운정사는 선생이 1700년경에 건립한 곳으로 지은 정사 중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건물이다. 1987년 12월 29일 경상북도민속자료 제76호로 지정되어 1990년 7월 상주시에서 보수하였다.
선생은 주자의 시구 중 "반무방당일감개(半畝方塘一鑑開) 천광운영공배회(天光雲影共徘徊)"에서 인용하여 '천운재(天雲齋)'라 하였다. 이 집은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크다.
ㄱ자집 건물로 2칸의 마루방과 2칸의 온돌방, 1칸의 부엌이 있으며, 마루방은 천운당(天雲堂), 온돌방은 양호료(養浩寮)라 하였다. 3량구조(三樑構造)에 홑처마집인데 천운당의 지붕은 맞배지붕, 양호료의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지은 점이 특이하다. 정사의 앞에는 조감당(照鑑塘)이라 이름한 방형의 연당(蓮塘)이 있으며 식산이 지은 <노곡기(魯谷記)>에 이곳의 전체 구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가 쓴 시 '새재를 지나며(過鳥嶺)'에서 '번거로운 세속 일, 헌옷 벗듯 벗어 던졌다'며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이만부 선생은 식산정사에 머물며 여러 선비들과 교류를 통해 학문을 나누며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쳤다.
■ 지행록(地行錄) 등 저서는 대한민국 역사에 으뜸으로 귀중하다.
시대를 뛰어넘을 만한 책을 저술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행록(地行錄)>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기행문으로서 가치가 높다. 장백산을 중심으로 한 만주지방에서부터 남해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손수 돌아보고 쓴 놀라운 저작이다.
그 가운데서 금강산의 바위들을 묘사한 아래 대목은 문학적으로도 완성도가 뛰어나다.
"꼿꼿하게 선 것, 비스듬히 누운 것, 세로 선 것, 가로지른 것, 둥근 것, 모난 것, 길쭉한 것, 얼굴을 맞대고 선 것, 울룩불룩하게 솟아오른 것, 한 무더기로 거대한 군락을 이룬 것, 아웅다웅 성이 나서 다투는 듯한 것, 굽어보는 것, 우러러보는 것, 반듯이 누워 되돌아 보는 듯한 것, 뛰어오르며 공중으로 발길질하는 듯한 것, 엎드려서 하소연하는 듯한 것, 벌떡 일어나 말다툼하는 듯한 것, 춤추고 웃고 성난 듯싶은 것 들이 모두 금강산 바위에 관한 것들이다."
그는 이밖에도 《식산문집》 20책 외에 《역통 易統》 3권, 《대상편람 大象編覽》 1권, 《사서강목 四書講目》 4권, 《도동편 道東編》 9권, 《노여론 魯餘論》 1권 등이 있다. 또한 외국에 대한 견문도 상당해 조선시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겠다.
이만부 선생은 권세 있는 집안의 가문의 자식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던 참 선비였다. 권력에 휩쓸려 당파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낙향하여 청렴한 삶을 산 그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지금이다.
■ 상주 북장사 전각 현판과 그의 문집
▲ 북장사 명부전 글씨는 이만부 선생의 친필 현판을 현재 모사하여 걸었으며 진본은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 상주의 유교 문화를 복원하고 보존해야
예천에는 근암서원이 있다, 바로 이곳은 식산 이만부 선생을 포함한 7현을 보시고 있다. 안동은 유교문화 운동으로 곳곳에 바위의 작은 글씨조차 보존하고 뜻을 풀이해 알리고 있다, 이러한 경상북도는 경주와 상주, 안동 등에 유교문화 흔적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
상주에는 우복 정경새, 소재 노수신, 창석 이준, 선생의 업적과 문화유산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도남서원 등 양진당 을 비롯한 문화유산들이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유교문화의 거두로 내 새울만한 인물이 없다며 안동지역 퇴계 선생을 중심으로 모든 유교 문화운동에 포함되고 마는 지역이 되었었다.
퇴계 선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물이 그동안 상주에서 쓸쓸히 잠들고 있었던 식산 이만부 선생이다,
그는 어느 한곳도 퇴계의 학문에 밀리지 않는다, 특히 청려한 정신은 조선시대 최고로 숭상 받아야만 한다.
또한, 지행록 등 저서는 대한민국 보물로서 보존과 학계를 통한 후학에 이용할 만 한 가지가 충분하기에 학술 대회 등을 통해 꾸준히 알려나가야 한다.
식산 이만부 선생의 봉분이 무너진 묘소는 쓸쓸하기 까지 했으며 묘소까지 올라가는 산길은 찾아보기조차 힘들었으며 이정표나 안내판 하나가 없었다.
그의 문집과 유물들은 곳곳에서 보관중이며 한곳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머물던 청운정사도 옛 모습으로 규모를 회복해야하며 전국 곳곳에 있는 문집과 간찰 등 유물들도 한곳에 모아서 청렴한 위대한 학자를 보고 배우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유교의 거두 중의 거두가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다, 상주시에서 어느 누구 보다도 위대한 인물은 관리조차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독창적인 유교문화가 퇴보되고 있는 것이다.
김남식 기자: yulha7@daum.net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북한 시장 물가·환율 동반 상승세
북한 시장 물가·환율 동반 상승세
 북한 9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 공식화 전망
북한 9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 공식화 전망
 네타냐후 “이란이 공격하면 상상 못 할 대응”…중동 긴장 고조
네타냐후 “이란이 공격하면 상상 못 할 대응”…중동 긴장 고조
 돈바스 영토 문제 놓고 우크라·러시아 평행선…전쟁 4년 앞두고 공세 격화
돈바스 영토 문제 놓고 우크라·러시아 평행선…전쟁 4년 앞두고 공세 격화
 북한, 환갑 잔치 포기 가정 ‘모범 사례’로 선전
북한, 환갑 잔치 포기 가정 ‘모범 사례’로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