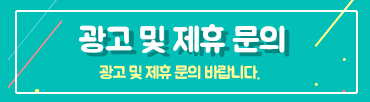남북한이 분단된 지 어느덧 60여 년이 흘렀다. 언어란 그 지방의 문화와 생활상을 반영하기 마련인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지역적 특색으로 토착화된다. 지방색이 강한 사투리는 그 지방 출신이 아니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물며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과 북은 기본적으로 같은 한글을 쓰기는 하지만 표현에 있어서나 발음상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선 김일성의 교시로 중국식 한자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로 바꾸었다. 이는 사상의 기반이 되는 언어사용에 있어 북한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 같은 이유로, 남한에서는 그대로 수용되는 외래어도 북한에서는 대부분 고유한 우리말로 대체된다.
가령, 스킨은 ‘살결물’로,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로, 장인은 ‘가시아버지’로, 장모는 ‘가시어머니’로, 액세서리는 ‘치레거리’로, 보트는 ‘쪽배’로, 주스는 ‘단물’로, 볼펜은 ‘원주필’로, 소시지는 ‘고기순대’로, 여성용 속옷인 브래지어는 ‘가슴띠’란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굳어진 외래어도 종종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가 과거 북한의 종주국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탱크를 '땅크', 트랙터를 '뜨락또르', 아파트를' 아빠트', 컨베이어를 '콘베야', 블록을 '쁠록', 게릴라를 '빨찌산'이라고 한다.
또한 1960년대 10 여만에 달하는 재일교포들이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일본문화에 의한 일어발음도 많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일성, 김정일은 계속적으로 비판했으나 이미 일본문화는 북한 상류층의 문화로 인식되면서 그대로 정착이 되어버렸다. 바로 남한에서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예로, 접시를 ‘사라’로, 목도리를 ‘마후라’로, 대야를 ‘다라’로, 리어카를 ‘구루마’로, 셔츠를 ‘샤쯔’로 사용하는 점이다.
단어 자체의 명칭 외에 그 어감이나 강세에서도 차이는 있다. 북한은 대표적으로 ‘ㅅ’ 받침을 잘 쓰지 않아 된소리 발음이 많지 않은데, 남한의 표준말인 귓불을 북한에서는 ‘귀젓’, 뒷걸음질을 ‘뒤걸음질’, 장맛비를 ‘장마비’로 쓴다.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에도 차이가 있다. 남한의 두음법칙에서는 여자, 유대, 익명, 양심, 역사, 노동이란 단어를 쓰는데, 북한은 '녀자', '뉴대', '닉명', '량심', '력사', '로동'으로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친애하는’, ‘위대한’ ‘경애하는’, ‘하시었다’, ‘웃으시었다’, ‘님’ 등의 높임말은 오로지 김씨일가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당연시되는 부모님, 사장님 등 윗사람을 공경하기 위한 접미사도 북한에서는 생략된다. 그러나 그 중 희한하게도 선생님만은 그대로 '선생님’으로 허용된다.
이렇듯 우리는 통일을 대비함에 있어서 단지 지역적인 결합이 아니라 그동안 격리되어 살아온 시간을 서로 흡수하고 화합해 나가기 위한, 보다 큰 의미의 언어, 문화적 통일을 꾸준히 모색하고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뉴포커스
- TAG
-
 장흥군, 2026년 새해 초매식 개최…. “풍어와 안전 기원”
장흥군은 9일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새해 수산물 첫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고, 장흥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을...
장흥군, 2026년 새해 초매식 개최…. “풍어와 안전 기원”
장흥군은 9일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새해 수산물 첫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고, 장흥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을...

 인스타그램 계정 1천7백만 건 유출 의혹 제기
인스타그램 계정 1천7백만 건 유출 의혹 제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목록으로







 젤렌스키, 러시아 에너지 공격 대응 새 작전 단행 예고
젤렌스키, 러시아 에너지 공격 대응 새 작전 단행 예고
 북한, 한국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에 공식 입장
북한, 한국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에 공식 입장
 북한 주민, 인민반 동원 대비 선불 비용 증가
북한 주민, 인민반 동원 대비 선불 비용 증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강력 반발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강력 반발
 우크라이나 중부 50만 가구, 러시아 공격 여파로 이틀째 정전
우크라이나 중부 50만 가구, 러시아 공격 여파로 이틀째 정전